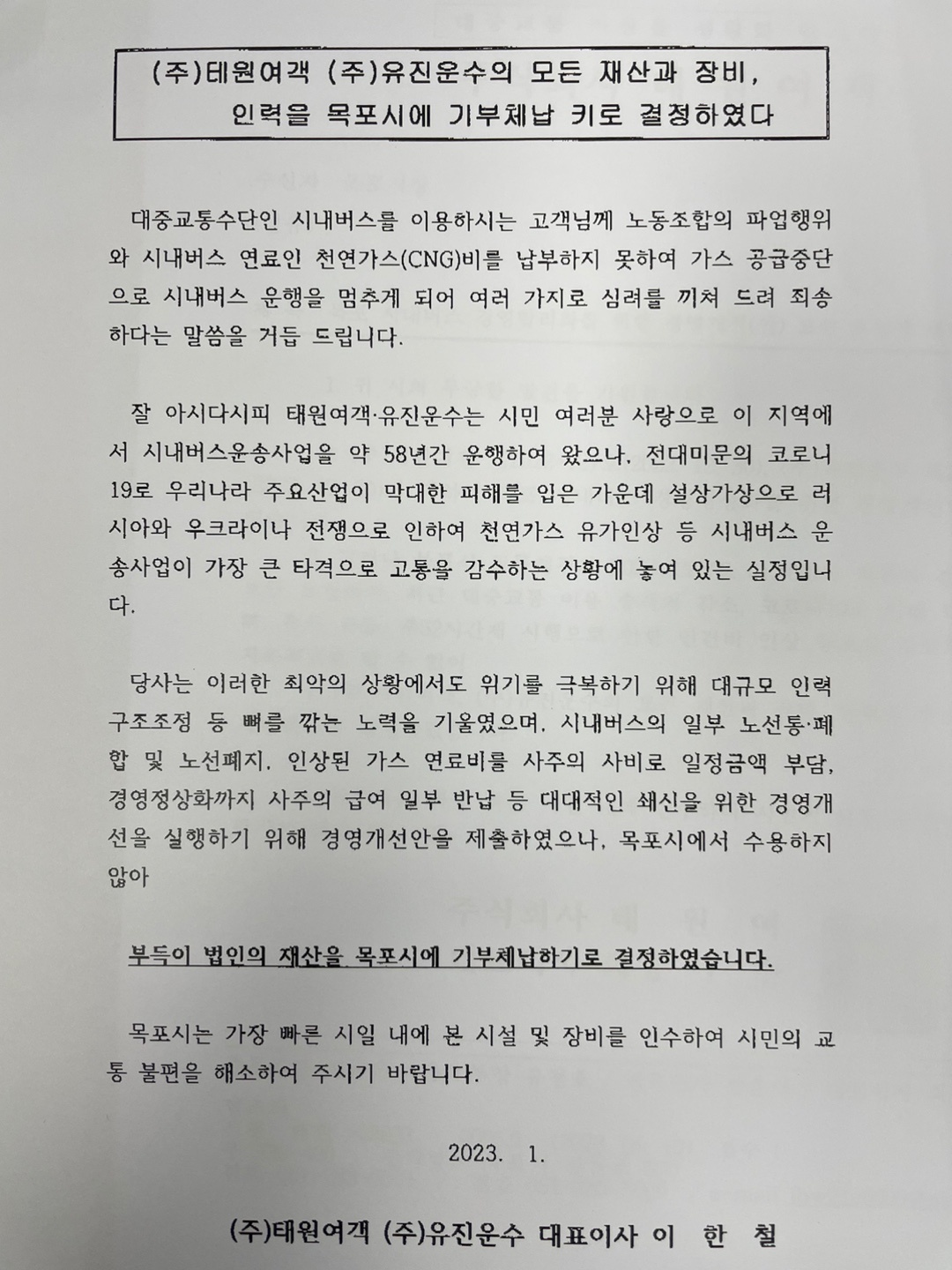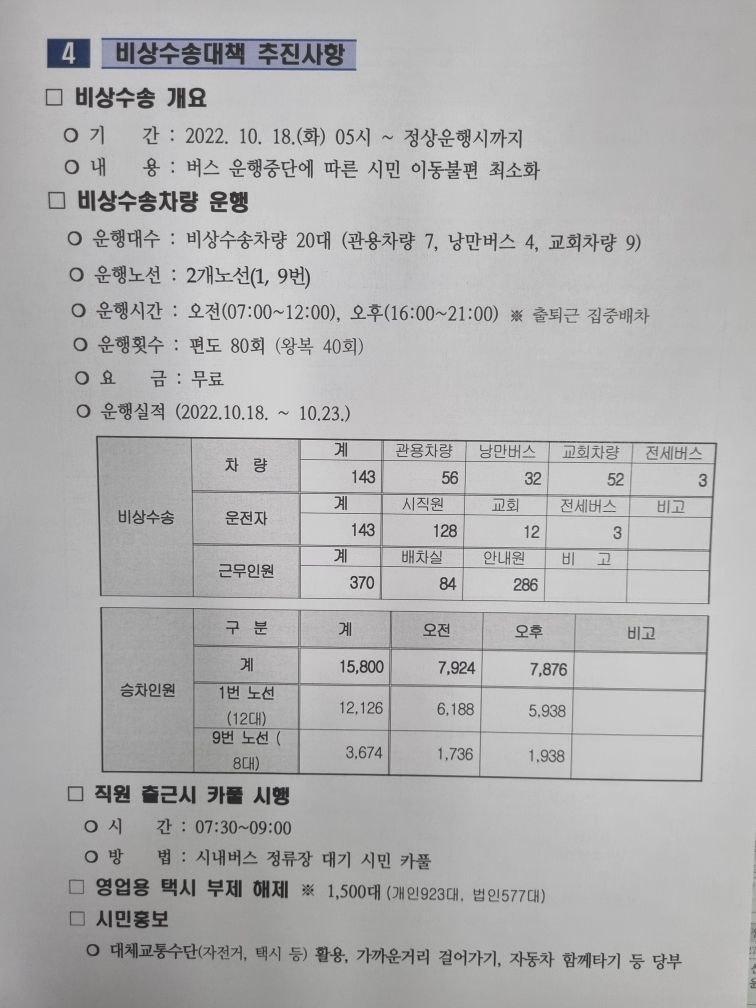* 木浦 - 김선태 이젠 아무도 말하지 않는 고목등걸처럼 캄캄한 너의 속살을 밟고 오늘도 유달산에 걸리는 파멸의 황혼 위로 아프게 돌팔매질을 한다 어둠 속에서 어둠의 사슬에 묶여 쓰러져 잠든 시간의 어디 쯤인가 빛바랜 삶을 거머쥔 깃발들이 만사(輓紗)처럼 항구에 나붓기는데 가신 님 오지 않아 기다림은 부두에 졸고 가물거리는 기억들이 하나 둘씩 바다 깊숙히 가라 앉는다 떠도는 말들이 바람이 되어 파도를 몰고 오는데 몸 사려 가시 돋힌 나날들이 기다란 영산강처럼 질펀하게 흐르고 매운 바닷바람 불면 짠물 한 됫박씩 마시고 모르는 곳으로 눈 돌리며 숨 죽인 거리 너는 외곬으로 바다같은 슬픔을 안고 목마른 울음만 안으로 안으로 훔쳐내고 있나 가슴 속에 한 웅큼씩 뜨거움을 감추고서 너는 또 어떤 시대의 아침을 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