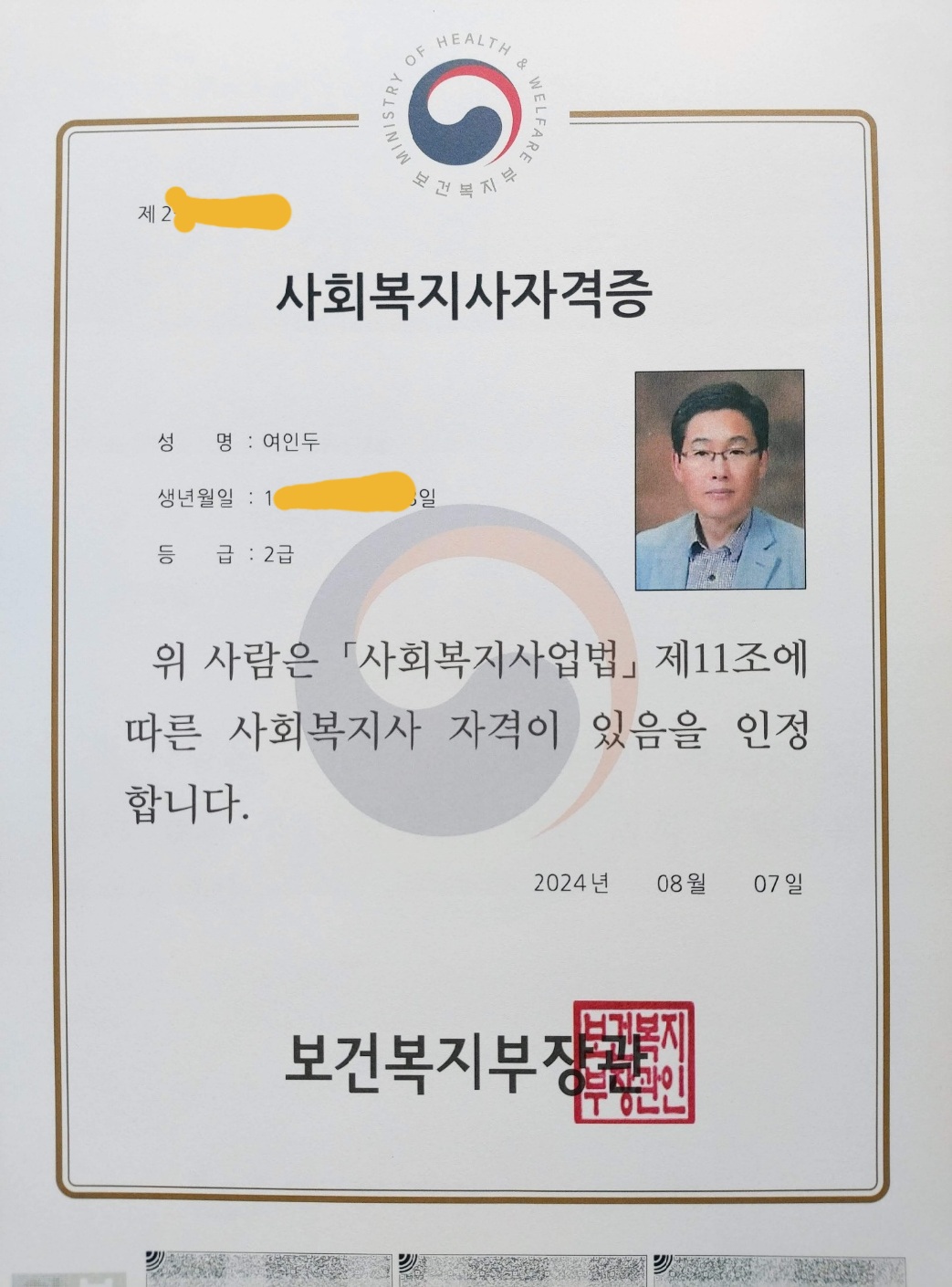곧 추석인데 아직도 폭염이 쏟아지고 있다. 이 폭염 속에서 일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를 것이다. 에어컨 밖 세상이 지옥과도 같다는 사실을... 양준혁군이 죽었다. 어린 학생들을 더위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위해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그날 교실밖 온도는 섭씨 35도를 웃돌고 있었고 에어컨이 고장 난 급식실은 그야말로 찜통더위였을 것이다. 그는 온열질환 증세가 나타나 쓰러지고야 말았다. 그런데 열사병 증상으로 쓰러진 그는 누군가에 의해 건물밖 화단으로 옮겨져 1시간 이상 방치되었다. 나무 그늘도 없는 그 화단에서 1시간여를 더위와 햇볕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의 곁을 지키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알량한 관리자는 그의 집에 전화를 걸어 그를 데려가라고 했단다. 양준혁군의 죽음은 명확히 중대재해다. 중..